-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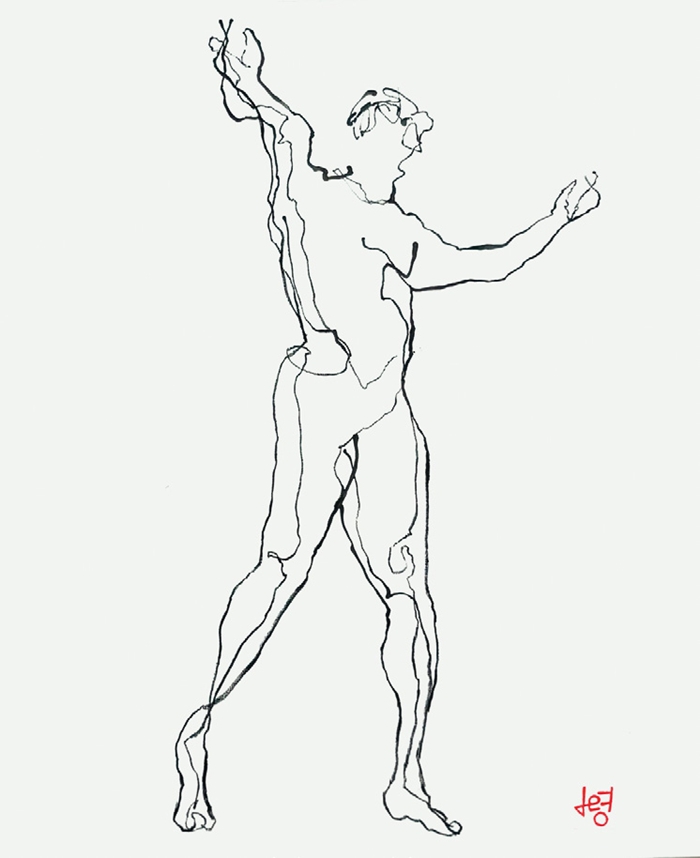
‘Drawing N.02’ Ink on Canvas, 45×54㎝
`십여 년 전 미국 오클랜드에 살며 사우스 샌프란시스코로 출근할 때, 왕복 10차선의 커다란 베이브리지를 건너야 했다. 교통체증이 어찌나 심하던지 첫 며칠 일곱 시에 출발해보곤 시간을 조금씩 앞당겼다. 여섯 시 반, 여섯 시… 급기야는 동트기 전 다섯 시!
그런데 아무도 없을 거 같은 시각에조차 신기할 정도로 도로는 여전했다. 꽉 차 있었고, 도시는 낯선 풍경으로 살아 있었다.
비슷한 경험을 서울에서도 한다. 요즘 들어 늘어난 불면의 밤에 뒤척이다 보면 몇 시인지 비몽사몽 중에 소리가 들린다. 띠-띠, 탁탁. 부우웅. 가끔은 호기심에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두리번거리기도 하는데, 며칠 전에도 일찍부터 잠이 깼다. 살금살금 집안일을 좀 하고, 티브이(TV)도 켜봤다가 컴퓨터도 만지작, 마침내 여섯 시가 되자 아담한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어디서부터 뛰어온 건지 궁금한 민소매 차림의 조깅족이 자그마한 트랙에 들어선 나를 제치고 뛰어갔다. 운동기구 구역은 이미 어르신들로 한가득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나왔을까?
가까이 다가가니 한쪽 구석에서 쪽 찐 곧은 자세의 은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공원 관리 유니폼인 예쁜 노란색 조끼를 입지도 않았고, 배낭과 책도 옆에 놓인 품이 운동 나온 사람이 분명한데,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청소를? 그는 기다란 싸리비로 시원시원하게 ‘쓰윽 쓱쓱’ 비질을 마치더니 화단의 나무둥치에 빗자루를 자전거용 자물쇠로 묶어 채웠다. 그 모습이 재밌어서 왜 그렇게 하시냐며 말을 걸었다.
“빗자루고 뭐고 안 걸어두면 하도 집어가니까 자물쇠 채우는 거죠. 청소하는 건, 내가 운동하는 공간인데 깨끗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한 게 아마 칠팔 년도 더 됐을걸요.”
이른 시간에 운동 나왔다는 게 자랑스러워 그 마음을 슬쩍 담아, “참 일찍 나오셨네요” 하니 그가 웃었다.
“새벽 세 시에 나와보세요. 그 시간에도 여기 꽉 차 있어요.” 세상에, 새벽 세 시라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기는 무슨,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항상, 누군가는 먼저 일어나고, 다녀가고, 해보는지…. ‘더 이상 어쩌라는 말입니까!’라는 나의 해묵은 투정도 떠올랐다. 일터에서도 삶에서도 많은 도전을 해왔는데, 매번 그랬지 싶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쥐어짜도, 누군가는 이미 해봤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솔로몬이 성경 ‘전도서’에 쓰긴 했지만, 이래서야 애쓴 보람이 있겠는가 싶었던 게 어디 한두 번이던가 말이다. 금세 헛수고가 될 일을 오랜 기간 매일 반복해온 어르신을 보며 오래전, 6개월밖에 사용 안 할 시스템인 줄 알면서도 몇 달을 밤새워 일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국수 조훈현이 ‘고수의 생각법’에서 그의 어린 날, 바둑에 이기고 오든 지고 오든 마당을 쓸고 잡일을 하도록 스승인 세고에 선생님이 시켰다는 이야기도 떠올랐다. 책에서는 감정의 파고를 일으키는 모든 걸 일상적인 일로 대하도록 마음수련을 시킨 거라 설명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삶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었나 한다. 즉, 삶의 의미가 경쟁이나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 지리멸렬한 일들로 채워진 반복되는 일상에 있다는 것 말이다. 성과로 인정받기는커녕 애쓴 결과마저 금세 사라져도 맥 빠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내는 모든 순간에 실은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엉뚱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린이 율동 동요인 ‘머리, 어깨, 무릎, 발’처럼, 어쩌면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머리, 어깨, 무릎, 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삶의 대부분은 노래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 싶다. 머리 대신 무릎일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릎, 어깨, 무릎, 발…. 글·그림 Jaye 지영 윤(‘나의 별로 가는 길’ 작가·화가)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새벽 세 시에 나와보세요. 그 시간에도 여기 꽉 차 있어요.” 세상에, 새벽 세 시라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기는 무슨,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항상, 누군가는 먼저 일어나고, 다녀가고, 해보는지…. ‘더 이상 어쩌라는 말입니까!’라는 나의 해묵은 투정도 떠올랐다. 일터에서도 삶에서도 많은 도전을 해왔는데, 매번 그랬지 싶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쥐어짜도, 누군가는 이미 해봤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솔로몬이 성경 ‘전도서’에 쓰긴 했지만, 이래서야 애쓴 보람이 있겠는가 싶었던 게 어디 한두 번이던가 말이다. 금세 헛수고가 될 일을 오랜 기간 매일 반복해온 어르신을 보며 오래전, 6개월밖에 사용 안 할 시스템인 줄 알면서도 몇 달을 밤새워 일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국수 조훈현이 ‘고수의 생각법’에서 그의 어린 날, 바둑에 이기고 오든 지고 오든 마당을 쓸고 잡일을 하도록 스승인 세고에 선생님이 시켰다는 이야기도 떠올랐다. 책에서는 감정의 파고를 일으키는 모든 걸 일상적인 일로 대하도록 마음수련을 시킨 거라 설명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삶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었나 한다. 즉, 삶의 의미가 경쟁이나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 지리멸렬한 일들로 채워진 반복되는 일상에 있다는 것 말이다. 성과로 인정받기는커녕 애쓴 결과마저 금세 사라져도 맥 빠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내는 모든 순간에 실은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엉뚱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린이 율동 동요인 ‘머리, 어깨, 무릎, 발’처럼, 어쩌면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머리, 어깨, 무릎, 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삶의 대부분은 노래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 싶다. 머리 대신 무릎일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릎, 어깨, 무릎, 발…. 글·그림 Jaye 지영 윤(‘나의 별로 가는 길’ 작가·화가)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