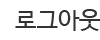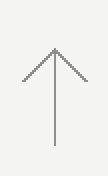-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소셜 벤처인 오셰어하우스의 오정익(34·사진) 대표는 서울 이화여대 앞 오셰어하우스 1호점에 산다. 셰어하우스의 경영자이자 입주자인 셈이다. 올해로 서울 생활 14년째인 오 대표의 ‘주거 이력서’에선 1인 가구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온 그는 하숙에서 시작해 자취 → 고시텔 → 원룸 → 투룸 등의 여러 방식으로 생활해 왔다. 그리고 2014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청년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 보려고 팔을 걷어붙였다.
“대학 진학이다, 취업 준비다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로 올라오는 지방 청년만 한해에 10만명이 훌쩍 넘을 겁니다. 하지만 1인 가구에 적합한 공간은 너무 적어요. 서울의 주택은 3~4인 가구 형태가 대부분이잖아요.”
오셰어하우스가 내세우는 첫번째 강점은 보증금이 적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려면 적어도 500만원은 필요한데, 이곳에선 두달치 월세만 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월세가 20만~30만원 수준이니 50만원 안팎의 보증금이면 입주가 가능한 것이다. 이 정도의 월세도 고시원의 50~60%에 불과한 수준이란다.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명색이 기업인데, 그럼 어디서 수익을 낼까? “발품을 부지런히 파는 거죠.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드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구식 여관 등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죠. 기대한 만큼의 수익은 나오고 있어요. 오셰어하우스가 많아져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더 좋겠지만.” 현재 5호점까지 문을 연 오셰어하우스를 내년 3월 봄 학기 전에 15개로 늘리는 게 목표다.
그렇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기존 주택이나 건물을 장기 임대하는 데 필요한 몫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게 무엇보다 큰 숙제다. 법적으로 셰어하우스의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탓에 정부 자금이 들어올 수 없고, 금융권 조달도 쉽지 않은 처지다. “금융권에서 펀딩이 쉬워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요.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셰어하우스 생활이 뭐가 좋으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그 이전까지 살았던 곳은 집이 아니라 그저 방이었죠. 음식을 해 먹기도 어려웠구요. 이젠 입주자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식사도 해요. 집밥을 먹는 거죠, 집밥을.”
정재권 선임기자
이어진 기사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